주요 소장유물 소개 - 조선의 마지막 초상화가, 채용신
- 유물명 주요 소장유물 소개 - 조선의 마지막 초상화가, 채용신
- 등록자 유물관리과
-
유물정보
서4054 채용신필 전우 초상
서1772 채용신필 박만환 초상
서45294 채용신필 유중악 초상 - 첨부
사진 확대보기

1. 서4054 채용신필 전우 초상
1931년
세로: 122.cm 가로: 4.2cm
조선 말기의 대학자였던 민재 전우(民齋田愚; 1841~1922)를 그린 초상화 이다. 전우는 1908년(순종 2) 나라가 어지러워지자 왕등도(暀嶝島)·군산도(群山島) 등으로 들어가 나라는 망하더라도 도학(道學)을 일으켜 국권을 회복하겠다고 결심하였으며, 부안·군산 등의 앞 바다에 있는 작은 섬을 옮겨 다니며 학문에 전념하였다. 1912년 계화도(界火島)에 정착하여 계화도(繼華島: 중화를 잇는다는 뜻)라 부르면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저술과 제자 양성에 힘썼다.
여기서 소개하는 서울역사박물관에 소장된 전우의 초상도 이모본이다. 석지 채용신이 그린 전우의 초상으로 장보관에 심의를 입고 공수한 궤좌상이다. 초상화에서 심의는 주로 복건을 동반하여 그려지나, 채용신의 작품에서는 장보관이 종종 등장한다. 백색 심의에 덧댄 흑연(黑緣)은 검은 색으로 칠한 면 아래 노란 바탕이 언뜻 드러나 비치는 직물의 느낌을 전달한다. 가지런히 모은 손 아래 나비 모양으로 묶은 대대에 오채조가 매듭지어져 있는데, 이전 심의 도상에서 보이는 것보다 끈 길이가 짧다. 얼굴은 잔주름과 검버섯, 한 올 한 올의 수염까지 선으로 세세하게 묘사하였는데, 그의 1930년대 초상화에섯 극세필의 표현이 줄고 부드럽게 면으로 처리한 질감이 주를 이루는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채용신은 전우와 실제 교류하며 여러 점의 초상화를 남겼다. 구한말의 우국지사를 즐겨 그린 채용신이 1920년에 전우가 살던 계화도를 방문하여 전우의 초상화를 그렸다. 이는 채용신이 쓴 『석강실기(石江實記)』에 기록된 사실이 있다. 이때 그린 전우의 초상이 이후 여러 이모본의 원본이 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들 이모본 얼굴, 자세, 찬문 등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 화폭의 좌측에 쓰여 있는 화기에 의해 채용신이 전우의 사후 1931년에 이모하였다고 쓰여 있는 것으로 보아 채용신이 전우의 생전에 그린 몇몇의 초상화들을 범본으로 그의 사후인 1931년에 이모하였음을 알 수 있다.
화면의 문장은 아래와 같으며 관서 끝에 주문방인 ‘석지(石芝)’ 1과가 찍혀 있다.
左右握公 方寸蘊直 좌우 두 손은 ‘공(公)’ 자를 잡고 있으니 마음에는 곧음을 간직하려네
旣直且公 宜成大德 이미 곧으면서도 공평하면 마땅히 큰 덕을 이룰 것인데
奈何所發 十九私曲 어째서 발(發)하는 것이 열에 아홉은 바르지 못한가?
求是去非 晦父遺囑 옳은 것은 구하고 그른 것을 버리는 것은 주자의 가르침이니
必要操存 氣必撿束 마음은 요컨대 종잡을 수가 없고 기운은 반드시 단속해야하네
期以屬纊 輩幸性復 죽을 때까지 기약하며 행여 본성을 되찾기를 바라네
辛未中秋上澣前大韓國從二品蔡石芝九十翁移摹寫
신미 음력 8월 상한에 전 대한국 종2품 채석지가 90세 노인으로 모사하다
2. 서1772 채용신필 박만환 초상
1910년
세로: 142.5cm 가로: 73.2cm
박만환朴晩煥(1849~?)의 본관은 구산(龜山-지금의 경북 군위)이고 호는 창암(蒼巖)이다. 조선말기 한학자로서 1907년 여성의 교육서인 중국의 『여사서女四書』를 언해(諺解)하여 간행하기도 했다.
화면 오른쪽에 ‘찰방박만환 육십이세상(察訪朴晩煥六十二歲像)’이라는 명문을 통해서 한학자이자 찰방察訪을 지낸 62세의 박만환을 그린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뒷면에는 ‘경술 사월 상한 종이품 전부사 채석지 사(庚戌四月上澣 從二品前郡守蔡石芝寫)’ 문장을 통해서 庚戌年(1910) 4월경에 61세의 채용신이 그린 것임을 알 수 있다.
박만환은 푸른색의 학창의를 입고 정자관을 쓰고 있으며 오른 손에는 부채를 쥔 채 화문석위에 앉아 있는 모습이다. 인물의 정면상을 그린 점과 앉아 있는 자세, 바닥에 그려진 화문석 등은 채용신이 관직에서 물러나 초상화 제작에 매진하던 1910년대에 제작한 작품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양식적 특징들이다. 갈색선으로 얼굴의 윤곽선과 주름을 그리는 동시에 서양식 음영법을 사용하였으며 콧등에는 하이라이트도 표현하였다. 옷주름도 윤곽선 주변에는 서양식으로 음영과 주름을 넣어 개화기 서양화법의 도입을 실감할 수 있다. 초상화의 뒷배경에 아무 것도 그리지 않은 것은 채용신의 1920년대 이후 작품에서 병풍이 등장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뛰어난 묘사력과 예술적 창조를 통해서 전신傳神의 경지를 개척한 채용신의 기량이 유감없이 발휘된 수작이다.
3. 서45294 채용신필 유중악 초상
1897년
세로 123.0cm 가로 62.5cm
초상화의 인물은 유중악(柳重岳)이다. 유중악(柳重岳, 1843-1909)은 자는 백현(伯賢), 호는 항와(恒窩)이며, 조선 말기의 학자이다. 그는 성학(聖學)을 ‘널리 글을 배우는 것(博文)’과 ‘예법으로 요약하여 행하는 것(約禮)’의 두 가지로 파악하여 도학의 학문적·실천적 성격을 선명하게 확인한 학자이다. 또한, 바르고 공변된 ‘성현의 학문(유학)’과 사특하고 사사로운 ‘이단(노장·불교·기독교)’을 대립시키면서 도학의 정통주의에 따라 배타적인 위정척사론(衛正斥邪論)으로 일관하였다.
이 초상은 정자관(程子冠)을 쓰고 심의(深衣)를 입고 앉아 앞을 향하고 있는 정면 좌상이다. 좌식 중에서도 전신(全身) 의좌상(椅坐像) 자세를 하고 화문석 위에 앉아 있고 두 손은 모아 앞을 향한다. 우측 상단에는 '긍와문공충렬 오십세상(恒窩文公忠烈 五十歲像)'이라 적혀 있어 유중악 초상임을 알 수 있으며, 우측 하단 묵서에는 '정묘 춘이월 상한 전부사 종이품 채석지 사(丁卯春二月上澣前府使從二品蔡石芝寫)', '石芝'의 인장이 찍혀 있으므로 채용신이 그린 초상화라는 것을 증명한다. 채용신의 기법에 따라 얼굴은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되었으며, 복식에서도 얼굴보다는 다소 기법이 떨어지지만 명암이 강하게 드러난다. 우측의 어깨선, 얼굴의 오른쪽면 일부 필획을 수정한 흔적이 남아있다. 뒷면에는 서양식 탁자에 책이 쌓여있는데, 맨 윗 상단에 『성리대전가례(性理大典家禮)』를 그려 넣어 유학자로서의 면모를 뒷받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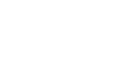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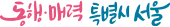

 서4054채용신필전우초상
서4054채용신필전우초상 서1772_채용신필찰방박만환초상화
서1772_채용신필찰방박만환초상화 서45294채용신필유중악초상
서45294채용신필유중악초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