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4년 서울의 인구 이야기
- 유물명 1934년 서울의 인구 이야기
- 등록자 유물관리과
- 유물정보 서15520 각정동직업별호구조서(1934년, 가로 19.3㎝×세로 26.8㎝)
- 첨부
사진 확대보기

오늘 아침 출근길에 본 신문 기사에 따르면 저출산으로 대학 갈 사람이 점점 줄어들어, 2020년이 좀 지난 시점에는 대학을 골라서 갈 수 있다 한다(물론 대학의 정원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전제하고). 2025년 쯤이면 지방의 대형 마트나 백화점들도 지방 인구의 감소로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 인구 문제는 근래 한국 사회에서 초미의 관심사다. 인구 감소가 미치는 영향이 사회 자체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 이처럼 인구는 국가 통치와 관리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정보이다. 이 사실은 과거나 현재가 마찬가지이다. 근대 서구적 행정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인구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는 방법이 더욱 고도화, 정밀화되었을 뿐이다.
이번에 소개하고자 하는 유물은 서울역사박물관이 소장한 다양한 인구 관련 자료 중 하나인 『各町洞織業別戶口調書』이다. 이 유물은 1934(소화9)년 말 현재 서울(경성)의 인구를 최하위 행정단위인 정町과 동洞을 기준으로 내지인(일본인), 조선인, 외국인의 민 족별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8개(농·임·목축업, 어업·제염업, 공업, 상업·교통업, 공무·자유업, 기타 유업자有業者, 무직자, 직업을 신고하지 않은 자) 직업별 범주로 분류한 통계자료이다. 호구는 호수와 인구를 지칭하는데, 호수는 다시 주거와 세대로 구분하였고, 인구는 남녀로 나누어 기록하였다.
족별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8개(농·임·목축업, 어업·제염업, 공업, 상업·교통업, 공무·자유업, 기타 유업자有業者, 무직자, 직업을 신고하지 않은 자) 직업별 범주로 분류한 통계자료이다. 호구는 호수와 인구를 지칭하는데, 호수는 다시 주거와 세대로 구분하였고, 인구는 남녀로 나누어 기록하였다.
○ 1934년, 서울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고 살았나 – 전국은 농업, 서울은 상업
당시 전국 조선인의 직업 분포는 농·임·목축업이 75.1%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반면 서울의 조선인은 상업·교통업이 31%로 가장 많고, 다음이 기타 유업자 22.8%, 공업과 공무·자유업이 각각 12.9%, 12.5%로를 차지했다. 일본인은 전국적으로 보면 공무·자유업, 상업·교통업에 각각 42.2%, 26.9% 종사하였는데, 서울의 일본인은 공무·자유업(39.4%)이 상대적으로 낮고 상업·교통업(34.6%) 비중이 높다. 외국인은 전국적으로 보면 상업(45.9%), 농업(21.8%), 공업(14.3%) 순이지만, 서울 외국인들의 직업은 상업(61%)이 압도적으로 높다.
○ 1934년, 서울에는 누가 살았나 - 내지인, 조선인, 그리고 외국인
호구조서에는 서울 사람들을 내지인(일본인), 조선인, 외국인으로 분류하였다. 1930년대 중엽까지 매년 전국 인구 중 내지인(일본인)의 비율은 2.7%, 외국인의 비율은 0.3% 이하였던 것에 비해 1934년 서울에는 일본인이 28%, 외국인이 1.5%를 차지했다.
○ 1934년, 서울 사람들은 어디에 살았나– 북촌, 그리고 을지로 남쪽과 남대문 주변
1934년 서울에는 조선인, 내지인(일본인), 외국인(특히 중국인) 등 동아시아 3국의 사람들이 서울 사람으로 살았다. 침략자와 상인으로 서울에 와서 서울 사람이 된 이방인들과 조선인들은 어디에 살았을까. 1934년 서울은 을지로(황금정)을 기준으로 일명 북촌에는 조선인들이, 남촌에는 일본인들이 많이 살았다. 1910년대 감소하던 중국인들은 1920년대 후반이 되면 남대문로 2·3가 서쪽으로 중국인 거리를 형성하였다. 서소문정(1164명), 태평통2정목(642명), 장곡천정(621명), 북미창정(201명)의 외국인들은 대다수가 중국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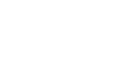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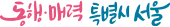

 각정동직업별호구조서_표지
각정동직업별호구조서_표지 각정동직업별호구조서_내용
각정동직업별호구조서_내용


